숭례문은 조선 시대 서울 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문이며,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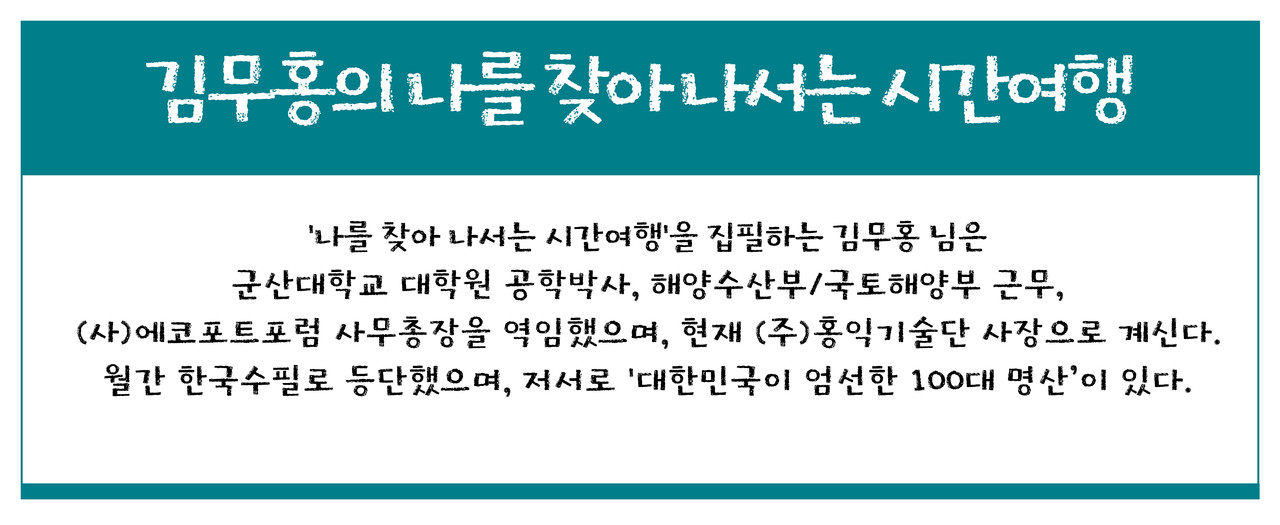
숭례문은 조선 시대 서울 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문이며,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다. 일반인에게는 서울의 남쪽에 있다 하여 '남대문'으로 더 알려졌다. 주변의 관공서나 시장, 건물, 종교 등의 명칭에서 ‘남대문’이라는 수식어를 가져다 쓰고 있을 만큼 남대문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각인된 상징물이다.
평소에 그냥 스쳐 가듯 힐끗 쳐다보기만 했던 숭례문이었는데 오늘만큼은 사뭇 진지한 마음을 가다듬어 몇 바퀴지 돌아봐야 하는 까닭이 생겼다. 2008년 2월 방화로 대부분이 소실되었다가 5년 만에 복구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됨에 따른 아픈 흔적을 알아보고자 함이 아니다. 국보 1호 숭례문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생각을 붙들어 맸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훈민정음해례본을 국보 1호로 대체 지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는 한글날에 즈음하여 반복되는 현안으로서 단지 훈민정음해례본이 주는 가치 때문만이 아니라 숭례문이 지닌 국보 1호에 대한 원초적 진실을 파헤쳐보자는 이유이다.

일제는 1934년 우리 문화재 등급을 매길 때 국보는 일본 말고 조선에는 없다고 단정하고 ‘보물’, ‘고적’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한정하였다. 그래서 보물 1, 2호는 숭례문과 흥인지문이 각각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는 일본의 국보 1호인 광륭사목조미륵보살반가상을 전해줬지만, 국보조차 가질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도시계획에 따라 한양도성의 주요 출입문이 전차 개설 등으로 모두 철거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임진왜란 때 숭례문은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개선한 문이고 흥인지문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입성한 문이라는 이유로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남겨두었다. 이는 1927년 『趣味の朝鮮の旅』 여행지에 숭례문과 흥인지문을 일본이 자랑스럽게 개선한 문이라고 소개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결국 일제와 무관한 돈의문, 소의문, 혜화문 등은 속절없이 철거를 당하는 수모를 안았으며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수치스러운 감투를 얻어 쓴 채 우리는 국보 1호, 보물 1호로 여긴다.
이에 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국보나 보물의 지정은 중요도를 따져서 번호를 매기기보다 내부에서 관리하는 일련번호 개념이기 때문에 별다른 가치 부여가 없다는 주장인데, 하필이면 그 관리 번호마저 일제가 부여한 순서대로 따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여러 번의 국정감사 지적과 감사원의 국보 지정 변경 권고가 있었음에도 문화재위원회가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부결하였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관련기사
- 청빈낙도 선비의 고향, 남촌
- 은둔의 오솔길에서 향기를 담다
- 남소문의 실체
- 불명예 오욕을 지켜본 광희문
- 옛 도시와의 뜻밖의 만남
- 훼손의 아픔과 복원의 과제 - 흥인지문
- 좌우 성벽을 완벽하게 갖춘 숙정문
-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온 한양도성
- 백악의 끝자락에서 하늘을 날다 - 가슴이 상쾌해지는 순성길 탐방로
- 유감없이 드러난 한양도성의 으뜸 절경, 백악마루
- 조선왕조 진산의 베일을 벗기다[1] - 옛 모습 그대로, 옹골찬 창의문
- 한양도성 순성길에서 시ㆍ공을 드나들다(3) - 한국의 몽마르트르 언덕 낙산 예술의 길
- 한양도성 순성길에서 시ㆍ공을 드나들다(2) - 성북동 뒷골목에 가려진 도성
- 한양도성 순성길에서 시ㆍ공을 드나들다(1) - 조선의 건국과 한양도성의 등장
- 해인사 소리길 트래킹
- 정선과 허준의 흔적을 찾아서
- 서천의 아늑한 송림과 저무는 갈대밭 기행
- 서글프고 아름다운 섬, 소록도
- 문화 예술의 발상지 서촌
- 시간을 붙들어 맨 문경새재
-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숨겨진 골목길2
-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숨겨진 골목길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