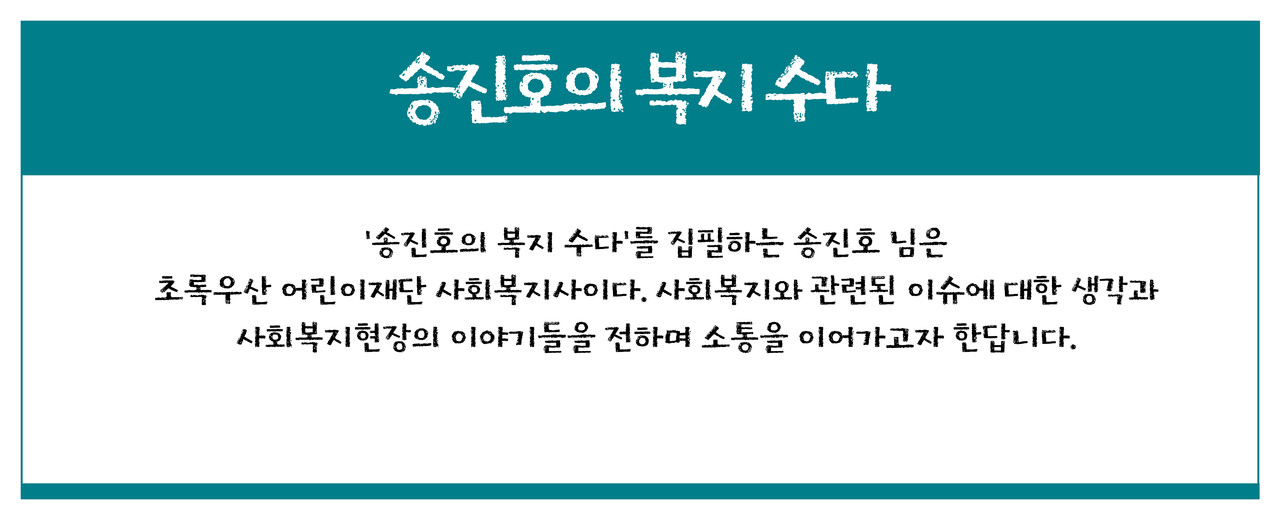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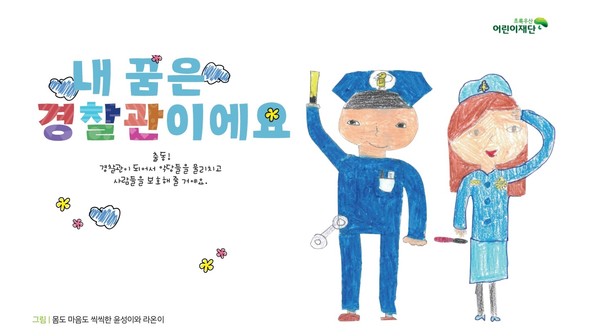
2014년의 어느 날 아침이었다. 회의 중에 아동양육시설 남자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대부분 축구선수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2002년 월드컵 이후 축구의 인기가 크게 높아졌고, 박지성, 이영표, 손흥민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선수들도 많았던 때라 그리고 월드컵이 열린 해라 더했겠지만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중학교 이전에 선수로 발탁되지 않으면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당시 나는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아이들에게 체육선생님이 될 것을 권하곤 했다. 체육선생님이 되면 하고 싶은 운동을 실컷 할 수 있고, 제자를 유명한 운동선수로 길러낼 수도 있으니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서 운동을 좋아하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에게도 체대를 가라고 권하고 있다. 그래서 아들의 꿈은 체육선생님이다. 우리 아이도 야구, 농구, 축구, 달리기, 태권도 등등 여러 종목을 좋아하지만 선수를 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축구공 밖에 없으니까 축구 밖에 할 줄 모르는거에요” 라는 후배 사회복지사의 말이 가슴에 확 닿았다. 보통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켜준다. 나 역시 그렇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라는 것이 제각각이다. 소위 부잣집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다양한 경험을 한다. 그리고 그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 하는 것에 대하여 꾸준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는다.
보통의 아이들은 경험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그 제한이 더욱 심하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성인이 되어간다. 그러다보니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해야하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굳이 공부가 아니더라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꿈에 대해 자주 묻는다. 많은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말한다. 아이들에게 내가 다시 묻는다. “달리기를 할 때,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과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 중 누가 이길까?” 아이들이 대답한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 이라고.

나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다. 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엄마 아빠는 이혼을 했고, 엄마는 혼자서 남매를 키웠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단칸방에 살아야 했던 만큼 우리 집은 가난했고, 재수생 시절까지 학원 한 번 제대로 다녀 본 적이 없었다. 중학교 때까지 성적 걱정을 해 본 적이 없지만 나에게 대학진학을 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무원시험을 보라거나, 기술을 배워야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사람들 뿐이었다.
내 꿈은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내 꿈을 응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교직을 이수해도 장애 때문에 임용이 안될꺼라는 현실적인(?) 조언 뿐이었다. 결국 나는 선생님이 되지 못했다. 교육 현장 대신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났다. 내가 만난 모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지는 못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사회복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질문을 포기하지마라”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꿈을 찾을 기회, 꿈을 꿀 기회, 꿈을 위해 노력할 기회, 꿈을 이룰 기회... 꿈을 위해 후회없이 노력해 본 아이들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하더라도 좌절 대신 다른 꿈을 꾼다.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