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
ODA사업을 통해 공여된 성과들이 현지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경우를 쉽게 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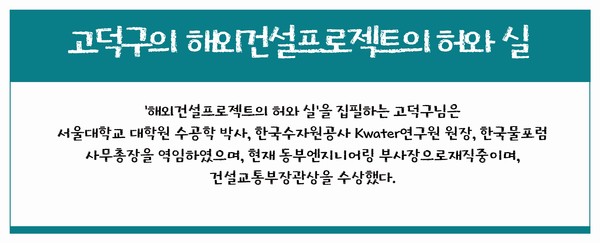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라고 정의되고 있다.(두산백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ㆍ사회발전ㆍ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을 통해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한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가난했던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공여국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룩하여 개발도상국 성장의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아 온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여 공식적으로 공여국 대열에 합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ODA 예산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우리나라의 ODA는 2010년 11.73억불에서 2018년 24.19억불로 106.2%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1.9%로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DAC 회원국 연평균 증가율 2.4%)
필자는 현재 건설 분야에서 조사, 설계, 감리를 업으로 하는 동부엔지니어링에서 ODA를 포함한 해외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사실 정부가 하고 있는 숭고한(?) 의미의 ODA사업과는 달리 개발도상국에서의 ODA사업거리를 발굴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하는 한편,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여 회사의 영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는 과거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에서 연구원으로서, 회사의 일부 해외사업 및 국제협력업무에도 참여했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에 파견되어서는 2015년 세계물포럼을 우리나라 대구에서 개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특히 물 분야에서의 국내 건설관련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K-water에서 정년을 하고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여 해외사업을 담당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해외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오만과 편견을 바탕으로 축적되어 왔는지를 알아가고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이 우리보다 현격히 기술과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과 오만을 가지고 다가가 보면, 현지에도 세계적인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우수한 인력과 타 공여국에서 이미 제공한 우수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물론 우리 시각에서 보았을 때 그 우수한 기술과 인력,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해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한 앞서 ODA사업을 통해 공여된 성과들이 현지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경우를 쉽게 목격하게 된다. “왜 그럴까?”하고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아니, 필자 본인이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앞으로 이 지면(EACH Journal)을 통해 짧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사례들을 하나 하나 공유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