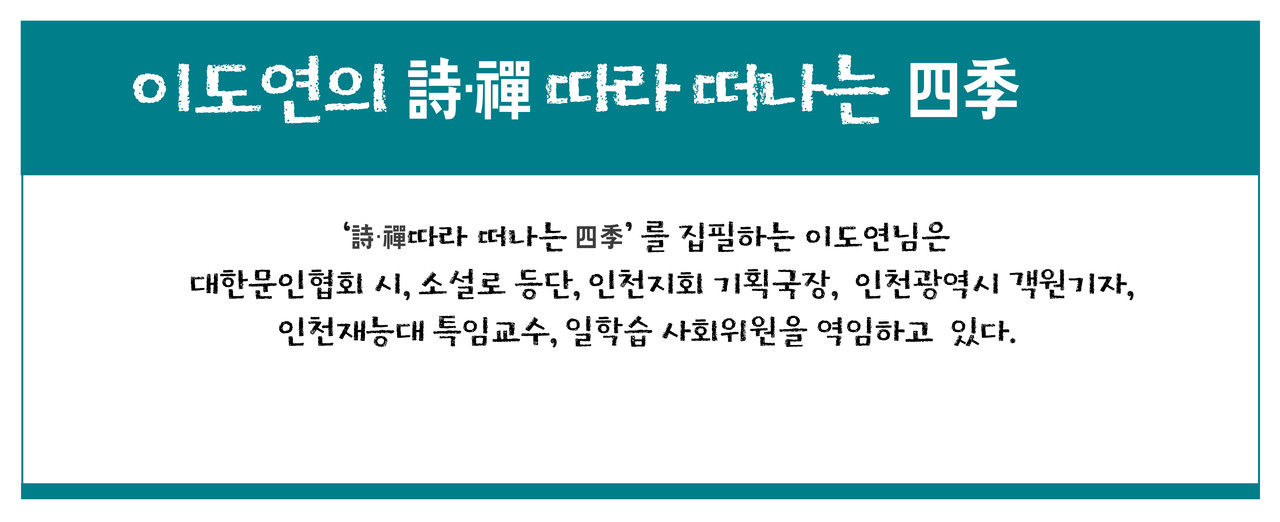
다음 목적지인 강촌역까지는 세 정거장밖에 되지 않아 단숨에 열차가 달려가는 듯하다.
역에 내리자 커다란 삼악산이 위용을 자랑하며 앞을 막아서고 뒤에는 검봉산이 병풍처럼 서 있고 높은 산 중턱쯤 되는 곳에 역사가 있다 보니 강촌의 골짜기 사이로 옹기종기 자리한 집이며 놀이 시설 숙박시설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으로 여행을 올 때면 으레 전원민박 아저씨와 통화를 하고 방을 사전 예약을 하므로 불편함 없이 민박집을 향한다. 숙박시설이 모여 있는 중심가 쪽이 아닌 구곡폭포가 있는 검봉산자락 중턱의 숲속에 자리한 아담한 곳으로 말 그대로 전원 민박집이다. 반갑게 마중을 나와 안내를 하는 민박집 아저씨는 그새 좀 더 마르신 것 같다 나중에 음식점에서 들은 이야기이지만 집 아래 땅을 팔았는데 사연이 있어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한다.
숙소에 도착하니 다소간에 긴장이 풀리면서 온종일 걸으며 나를 데리고 다니던 다리가 불편을 호소하고 배낭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허리도 뻐근하니 통증이 왔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짐을 풀고 이곳에 오면 들리는 단골 춘천 닭갈비집으로 시장기에 허기를 달래며 언덕을 내려간다.
시어머님이 하시던 가계를 물려받아 대를 이어 열심히 일하는 앳된 며느리가 이제는 제법 어엿한 주인 티가 난다.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모습에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안내한다. 마치 오랜 친척같이 안부를 묻고 주문을 한다. 춘천 닭갈비에 강원도 옥수수 막걸리를 몇 순배 하고 나니 불그스레하게 술기도 오르고 부러울 것이 없으며 온종일의 여독이 모두 스르르 풀리는 순간이다.
맛난 닭갈비와 막걸리를 한잔하고 소화도 시키기 위해 어둠이 내려앉은 비탈길을 따라 강촌의 중심가인 강가 쪽으로 산책을 한다. 언제와도 변할 것 같지 않은 길들을 익숙하게 바라보며 산중의 시원한 공기를 가슴 깊숙이 부담 없이 크게 호흡을 해본다.
어린 시절 물을 사 먹는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던 것처럼 언제인가 이렇게 청량하고 신선한 공기를 비싼 값에 사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민박 모텔 MT 환영 단체 방 있음 다양한 간판들이 경쟁하듯 줄지어 서 있다. 공터 여기저기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사륜 바이크와 자전거 대여소가 여기는 강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시골 읍내 같은 마을 중심가의 편도 이차 선의 길을 따라 걷다 강가 쪽에 화려한 불빛에 이끌려 자전거 길이라고 쓰인 길을 따라 강가로 걸어본다. 학창시절 기억 속의 출렁다리는 아니지만 현대식 조명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은은한 파스텔 색조의 아름다운 빛을 뿜으며 강을 가로질러 놓여있다.
학창시절로 돌아가 다리의 중간에서 발을 굴려 보니 출렁거리는 다리 위에서 비틀거림이 추억 속으로 돌아가 마냥 즐겁다. 다리 건너편은 다리를 고정하는 로프 뒤에 마치 영화의 필름 같은 조형물로 다리와 함께 전체가 영화필름을 감고 있는 영사기 모양의 조형물로 꾸며 놓았다. 영사기 조형물 뒤에는 옛날 강촌의 모습을 년도 별로 담은 사진과 이 지역의 시대별 변천사를 정리해 놓아 한눈에 강촌의 변화를 볼 수 있어 추억의 문학작품을 읽는 느낌이다.
학창시절 강촌 강가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던 추억이 지금 다리 위에 돌아가고 있는 필름 속에 고스란히 투영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마트에 들러 숙소에 돌아가 그냥 자기가 아쉬워 막걸리 한 통과 약간의 안주 그리고 내일 아침으로 지치고 불쌍한 위장을 위해 얼큰한 해장용 라면을 사 들고 숙소를 향해 느릿한 걸음을 걷는다.
십오 분 정도 걸려 숙소 입구까지 제법 긴 언덕길을 올라와서 때 아닌 봉변을 당했다. 먹을 것을 찾아 내려왔는지 산중 민가로 내려온 고라니 녀석과 지척에서 정면으로 마주치는 바람에 소리를 질러 사람은 고라니에 놀라고 고라니는 사람의 비명에 놀라 이리저리 뛰다 길가 담벼락을 한 차례 들이받고는 산 위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충격이 컸는지 풀숲에서 푸른빛으로 눈을 번쩍이며 한동안 움직이질 않았다.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나니 고라니가 상처나 입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다.
사가지고 온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구름이 잔뜩 끼어 더욱 깜깜한 산속 오두막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며 내일의 여정을 위해 깊은 단잠에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