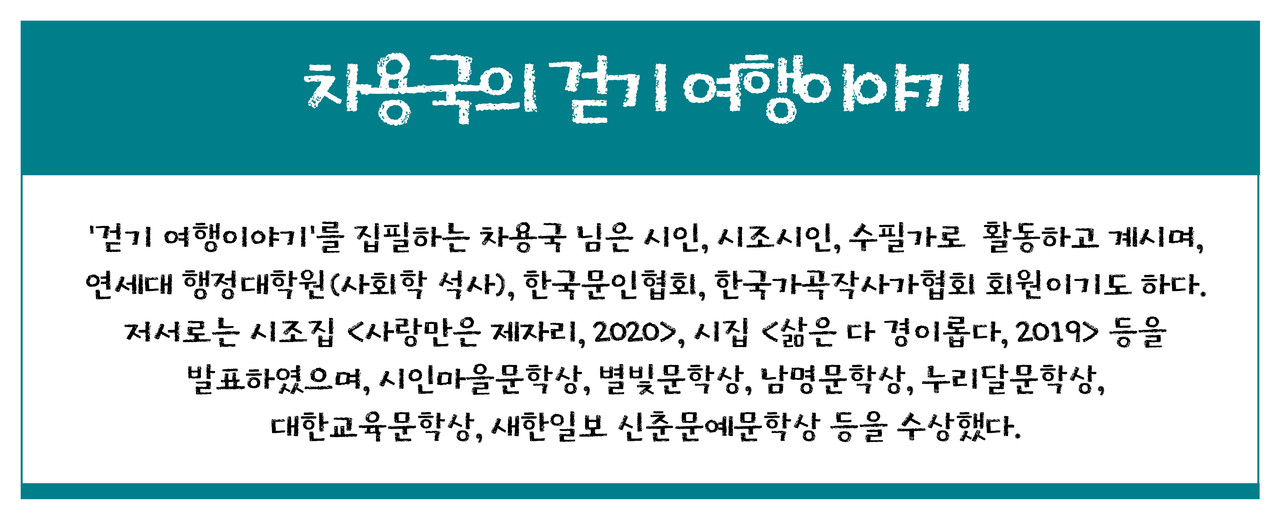

새끼곰이여, 안녕 (1)
- 독일 베를린행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아침에 그쳤다. 먹구름이 밀려난 북한산에 맑은 햇빛이 쏟아진다. 토실토실한 흰 구름 몇 점 떠있는 멋진 서울 하늘! 비 온 뒤 서울 하늘은 이토록 눈부시게 청명한데, 아쉽게도 이 아름다운 하늘이 겨우 이삼일 정도다. 이후에는 미세먼지에 찌든 희뿌연 하늘이다. 그러기에 서울은 이삼일마다 비가 와야 한다. 어린아이 속살같이 해맑은 원래 서울 하늘을 기억하기 위해서.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간다. 2018년 1월부터 대한항공은 그곳에서 운항한다. 공항에 도착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키오스크에 셀프 체크인을 한다. 예약사항만 기계에 인식시키면 탑승권이 출력되니, 매표구 앞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유용하고 편리한 시스템이다.
그런데 큰일이 났다. 키오스크가 내 동료의 탑승권 발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니 항공권 상의 이름 표기가 여권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 동료 이름 중 '식'의 영어 표기가 여권에는 'SICK'인데, 항공권 예약에는 'SIK'으로 되어 있었다. 황당하고 초조한 시간이 다급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동료는 이 난감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고, 나는 그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태연한 척했다. 다행히 문제는 항공사에서 해결해 주었지만, 비행기를 탈 때에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볼 일이다.
암스테르담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베를린 직항이 없기 때문이다. 비행기는 14시 5분에 이륙했다. 하늘에서 보는 서해의 섬들은 예쁜 모습 그대로 그림이다. 올망졸망 앙증맞게 펼쳐진 멋진 수채화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섰다. 이제부터 길고 지루한 여정이다. 잠을 청했지만 쉬이 올 잠이 아니니 어쩌랴. 창밖을 본다. 시선 끝 저 멀리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맞닿아 있다. 하늘과 바다가 자리를 바꾼 수평선 위에서 구름이 물구나무를 서고 있다. 그러니 운평선이라 하자. 서해를 지난 운평선 위로 산맥이 뒤를 잇더니 어느새 사막과 설원이 연속 필름처럼 돌아간다. 다음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새로운 풍경을 기대하며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삶도 이와 같으리라. 적지 않은 고비를 건너와 생의 어디쯤 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새로운 길에 들어설 때면 얼마나 가슴 벅찬가?
깜박 졸았나 보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눈을 뜨자 음식 냄새가 콧등을 스친다. 기내식사다. 비빔밥을 주문했다. 고추장과 참기름을 풀어 간을 맞추니 제법 맛나다. 식사를 마친 후 기내는 소등상태에 들어갔다. 내가 창문을 보고 있자 승무원이 다가와 닫아 달라고 한다. 그래, 식사도 하였으니 한 숨 눈을 붙이자. 눈을 감았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다.
7시간 넘게 비행기 안에서 꼼짝 없이 갇혀 있자니 답답하고 엉덩이도 아프다. 몸도 풀고 화장실도 가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 창 쪽 자리에 앉은 내가 복도로 나가려면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내주어야 한다. 그들은 눈을 감고 있다. 그들도 지루하고 피곤하긴 나와 다를 바 없을 텐데, 나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귀찮을까? 조금 더 참고 기다리자 다행히 두 번째 기내식이 나왔다. 식사를 마치고 복도로 나와 몸을 푼다. 문득 시계를 보니 서울은 깊은 잠에 빠져있을 시간이다. 비행시간은 아직 한참 남았고, 체력도 인내력도 바닥이다. 고문 중에 상 고문이 이런 게 아닌가 싶다. 좁은 공간에 하염없이 앉아 있게 하는 것.
암스테르담공항에 도착했다. 현지시간 오후 6시 55분. 서울과는 7시간의 시차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후 8시 45분 출발 예정인 베를린행 비행기는 20분이나 지연되고 있다. 암스테르담공항의 운영 시스템은 그다지 스마트해 보이지 않는다. 출발 예정시간에 맞추어 탑승절차를 마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출발시간이 지났고 승객들은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공항의 탑승절차는 느리기만 하다.
드디어 베를린공항에 도착했다. 15시간이 넘는 여정이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한다. 열어 놓은 창문을 스치는 밤바람은 시원하고, 거리는 한적하다. 고즈넉한 중소도시의 밤풍경이다.
아침 6시. 일정부터 살펴본다. 유엔 정보통신기술협력 심포지움 첫날의 일정은 참가자 등록과 간단한 자기소개다. 티어가튼 공원을 가로질러 전승탑을 보러간다. 플라타너스 나뭇잎을 흔들며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싱그럽다. 전승탑은 프로이센 시대의 건축물이다.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과의 전쟁 승리 기념물로 하인리히 슈트라크스가 1864년부터 1873년에 걸쳐 지었다. 원래 독일제국의회 의사당 앞에 있었던 것을 나치가 1939년에 이곳으로 옮겼다. 탑 꼭대기에는 프리드리히 드라케가 조각한 승리의 여신상이 금빛 찬란하게 서 있다. 웅장하고 화려한 기상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솟아오르고 있다.
탑을 내려와 회담 장소로 간다.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다. 회담장에는 각국에서 50여 명의 인사들이 왔다. 유엔이 오픈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지형정보시스템을 만들어 국제평화유지군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이다.
오후 일정을 마치고 브란덴브르크문을 보러갔다.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가 동쪽을 향해 달려가는 조형물을 장식한 문은 웅장하고 아름답다. 이 문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의 지원으로 칼 고트하르트 랑한스가 설계하여 1788년부터 1791년에 걸쳐 지었다. 문을 지나는 순간 바람이 뒤통수를 홱 후려친다. 나는 격한 감동과 아쉬움으로 바람을 본다. 바람은 위대한 독일을 당당하게 자랑했다. 나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듣고 있을 뿐.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다. 냉전의 시대, 분단된 독일은 이 문을 통해서만 동ㆍ서 베를린을 왕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문은 동ㆍ서 베를린의 경계였고,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독일은 1989년 베르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1990년 통일을 이루었다. 이제 이 문은 독일 통일의 상징으로 변신했다. 얼마전(2018. 4. 27)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고 휴전선을 넘어 남ㆍ북을 오갔다. 판문점이 이 문처럼 위대한 통일 한국의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간절하다.
브란덴브르크문에서 훔볼트대학을 지나자 베를린대성당이 있다. 1747년에 지은 이 성당은 웅장하고 화려하다. 신비로운 하늘색 돔 지붕과 검게 물든 벽면은 오래 묵은 세월의 신비로움까지 더해준다. 이 성당은 원래 호엔촐레 가문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었다. 삶과 죽음이 경계를 따로 두지 않고 한 공간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면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예술이 탄생하나 보다.
성당 앞 넓은 잔디 광장에는 시민들이 휴식과 놀이를 즐기고 있다. 한가롭고 평화로운 풍경이다. 하지만 이 평화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광란의 시대가 이곳을 그냥 놔두고 지나칠 리가 있었겠는가? 나치는 이곳에서 연일 선동 시위와 퍼레이드를 벌였다. 불행한 과거의 역사였다. 지금의 독일은 그 시대의 과오를 철저히 사과하고 극복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 그들은 잘못을 참회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지킬 의지가 있을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진실을 실천하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유엔 정보통신기술협력 심포지움에서는 평화 유지를 위한 도전 요소와 정보통신기술 활용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지금 인류는 기술문명의 초고속 발전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기술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다. 이런 점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다각적인 시도는 시의적절하다.
(계속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