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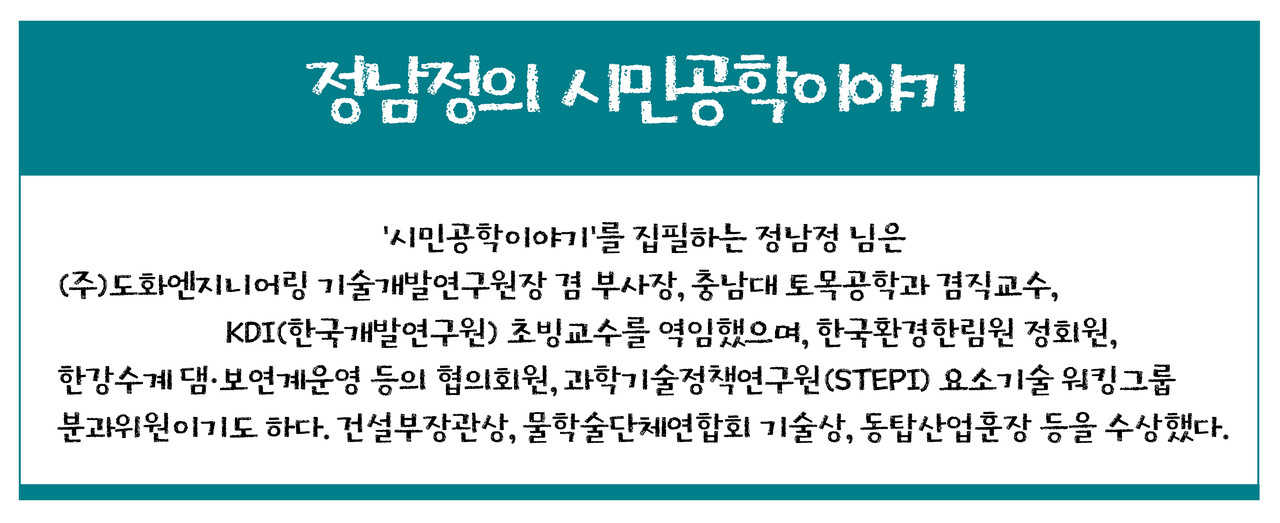
조선 세종 이후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쓰인 기구로 1441년(세종 23) 8월에 호조(戶曹)가 측우기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여 서운관(書雲觀)에서 측우기를 제작하고, 다음해 5월에는 강우량 측정 즉, 측우에 관한 제도를 새로 제정하여 서울과 각 도(道)의 군현(郡縣)에 설치하였다. 원래 측우기가 쓰이기 이전에는 각 지방의 강우량의 분포를 알아내는 데 매우 불편하였다. 즉, 비가 내림으로써 흙속 깊이 몇 인치까지 빗물이 스며들었는지를 일일이 조사해 보아야 하는데, 이때 흙에는 마르고 젖음이 같지 않아 강우량을 정확히 알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측우기는 일정기간 동안 그 속에 괸 빗물의 깊이를 측정하여 그 곳의 강우량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
측우기는 안지름이 주척(周尺)으로 7인치(14.7cm), 높이 약 1.5척의 원통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올 때 이 원통을 집밖에 세워 두면 빗물을 받을 수가 있다. 측우기에 괸 물의 깊이는 자[尺]로 측정한다.

측우기는 흔히 장영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졌는데, 세종실록 23년 4월 을미(양력 1441년 5월28일)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비 온 뒤에 땅을 파서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었으나 정확하게 푼수(얼마에 상당한 정도)를 알 수 없었으므로 구리로 만든 원통형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여기에 고인 빗물의 푼수(1푼은 약 2 mm)를 조사했다'는 기록은 문종에 의해 발명된 사실을 뒷받침한다. 5월 19일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 측우기의 발명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날이다. 이상은 [네이버 지식백과] 측우기 [測雨器] (두산백과)에서 옮겨왔다.
조선시대에 측우기의 용도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다고 한다. 다수의 견해는 측우기라는 표준기구를 통해 측정한 전국의 우량을 취합하여 농정의 합리화를 꾀했다는 주장이다. 1442년 측우기가 도입된 이후 농사의 풍흉을 감안하여 세율을 조정하는 연분등제(年分等制)가 도입되었으나, 측우기로 측정한 강우량을 활용하였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연분등제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측우기는 기우제의 도구이거나, 하늘이 내린 비의 양을 통해 국왕의 정치에 대한 하늘의 평가를 엿보는 점성술의 도구였다는 설도 있다고 한다.
시민공학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하기 위하여 자연현상인 강수량(강우+강설), 풍속, 지진, 기온과 동결심도(凍結深度), 증발과 같은 여러 가지 기후와 기상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 중에서도 강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에 속한다.
도시를 건설하거나 교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로를 만들고, 우수가 토양에 침투하면 지반이 연약해져서 건물이 무너질 수 있고,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는 우수로 인하여 침식이 일어나 다리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 단위의 강우강도, 즉 강우량은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하천의 제방이나 도시의 배수로는 아무리 큰 강우라도 안전하게 흘려보내도록 설계와 시공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 엄청난 규모로 건설하여야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리 구조물에는 경제성을 감안하여“설계 강우”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름철 우기에 기습적인 폭우로 인하여 광화문 앞 광장이 물바다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인재(人災)이니 자연재해(自然災害)이니 논란이 일곤 한다. 분명 설계 강우강도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 물바다가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다만, 수로를 관리하지 않아 흙과 나뭇가지 그리고 쓰레기가 쌓여 통수단면이 작아서 일어난 일이라면 인재로 봐야 한다. 따라서 측우기를 통하여 측정된 강우량은 농경이나 도시기반시설의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 2011년부터 하수관의 설계기준을 강화해 강우강도 확률년수를 ‘10~30년 빈도’로 상향 조정했다. 지선 하수관의 강우강도 확률년수는 5년에서 10년으로, 간선은 10년에서 30년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년 강우량의 2/3가 여름철 4개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홍수조절과 더불어 갈수기에 사용할 물을 저장해야 하는 물관리가 어려운 국가로써 정부에서 다목적댐을 건설하였는데, 댐의 규모를 결정하고 물관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강우량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세종대에 측우기가 발명되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과학적 사고능력이 뛰어나다는 반증이나, 이러한 발명이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되지 못하였고 지금에 와서는 수량과 물의 역학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이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