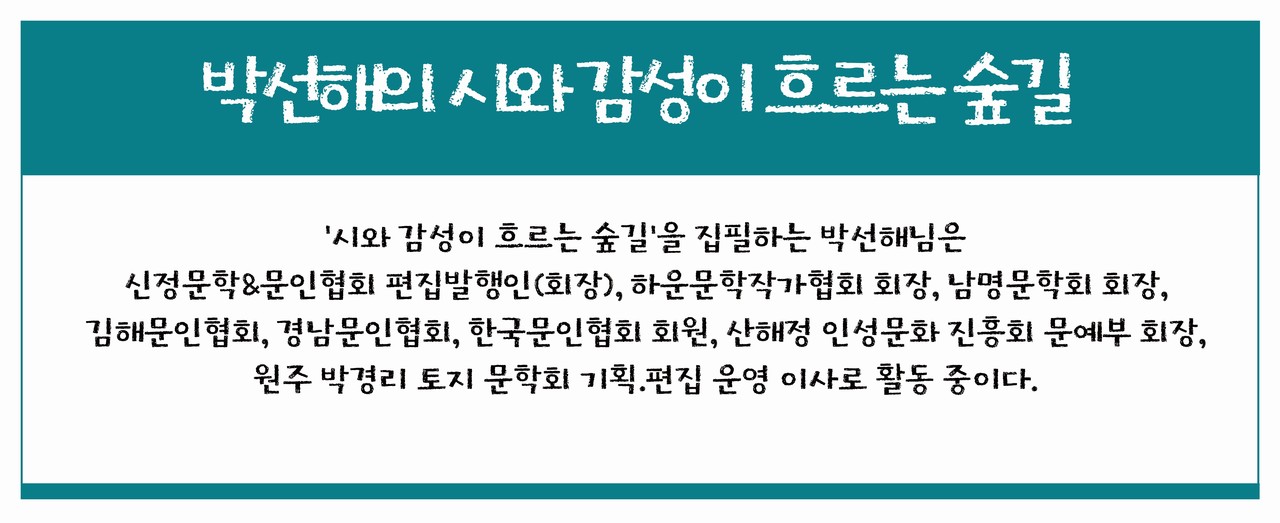

서울에서 온
하얀 고무신을 만난 뒤
가무잡잡한 손과 발
그을린 얼굴이 한없이 부끄러워
문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다가
그 하얀 미소 오래도록 생각 나
여명이 열리기도전
메마른 들판을 가로질러
울창한 숲길을 내달렸다
몸을 접어 물 위에 떠 있어도
백조처럼 우아한 흰색과
까마귀처럼 검은 고무신
덜컹거리는 가난을 달려
회색빛 도시에 산 지 삼십 년
동그랗게 뜨고 보던 까만 눈동자
아직도 물고 있는
그때,
그 아득한 그리움.
시인 - 박준희
충북 청주 출생
시사모 동인
2019년 시와 편견 신달자 시인 추천으로 등단
동인지 <내 몸에 글을 써다오>외 공저
시 감평 / 시인 박선해
고무신은 시절의 민족적 사회적 정서로서 그냥 생필품인 신발이 아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어렸을적 까무잡잡한 시골소녀가 방학때만 되면 놀러오던 하얀 얼굴의 서울 사는 소년을 좋아 했지만 끝내 이루어 지지 못한 사랑의 그리움을 안고 지내다 문득 떠오르는 소절을 표현해 냈다. 유년의 시나 소설속의 하루처럼 누구나 있을 것이다. 시골의 유년엔 장미꽃보다 찔레꽃이 그렇고 글라디 올러스꽃 보다 꽃나리나 창포꽃이 그렇다. 얼마나 그때가 가슴 두근두근한 순수와 긴장과 천사같은 웃음이 마주 보이는 논두렁 밭두렁을 동리길을 누볐을까! 함께 그 시절을 되뇌여 보니 동질의 동심이 미소 지으며 눈앞에 다가 선다. 수줍던 같은 그 그리움이 어디선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삶이 그렇듯 같은 하늘의 달무리가 다르지 않듯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