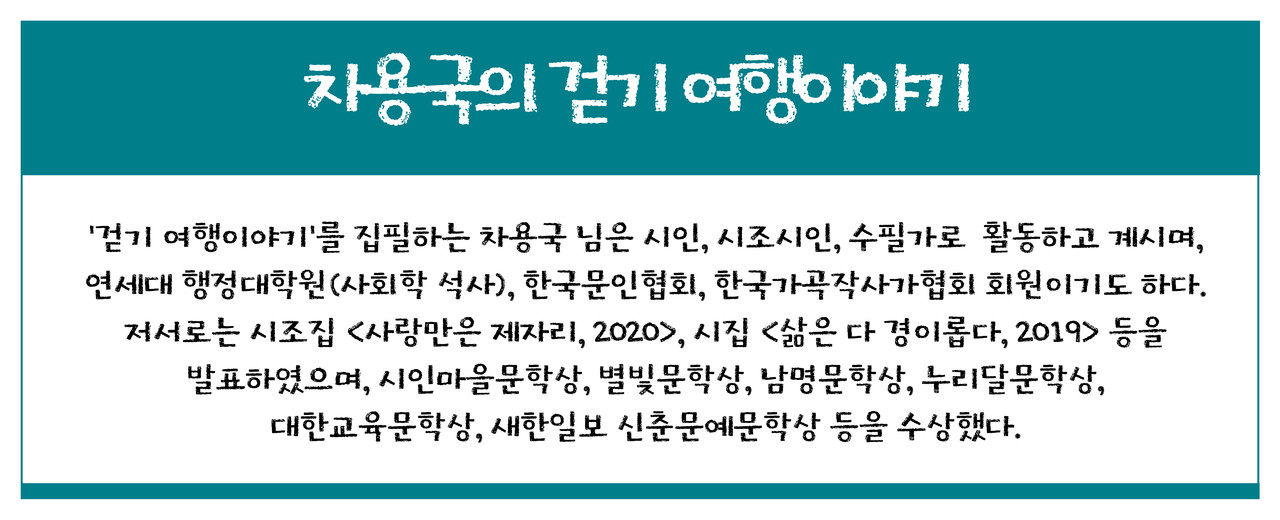
어제 저녁에 비가 조금 오는가 싶더니 찔끔 빗방울 흘리는 시늉만 하고 말았던 모양입니다. 날씨는 잔뜩 흐려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 부을 것만 같은데, 뭘 그리 오래 뜸을 들이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에서 내려 백운계곡 길을 따라 산으로 갑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물이 있으면 좋으련만 계곡은 말라 있습니다. 계곡도 비가 그리운 유월입니다.
치마바위에 오르니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습니다. 바위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노원구 전경을 바라봅니다. 우리 집도 저곳 마들역 주변에 있습니다. 서울에 와서 처음 장만한 작은 아파트입니다. 도봉산, 수락산, 그리고 불암산이 병풍처럼 펼쳐진 포근한 동네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용산구 삼각지로 출근하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새벽에 잠이 덜 깬 어린아이를 솜이불에 감싸서 같은 또래 아이를 두세 명 돌보아주는 아주머니 댁에 맡기고 출근을 할 때면, 가슴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곤 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잠들면서 함께 있었던 엄마와 아빠는 없고, 낯선 공간에 홀로 남겨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이는 자라면서 두 가지 버릇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엄마 옆을 치대면서 버티다가 쓰러져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늦잠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걸까? 이제 훌쩍 세월을 가로질러 대학생이 된 지금도 올빼미족이 되어 늦게 잠을 자나 봅니다.
둘째는 그 솜이불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새 이불로 갈아주려고 그 이불을 큰 쓰레기 봉지에 넣어 베란다에 잠시 놓아두었습니다. 아이는 잘 시간이 넘었는데도 졸린 눈을 비비며 집안을 이리저리 심란하게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서 자나보다 하고 방문을 열었는데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과 침대 밑까지 샅샅이 살펴보아도 보이지 않은 아이를 발견한 곳은 베란다였습니다. 아이는 그 솜이불을 넣은 큰 쓰레기 봉지를 끌어안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후 엄마는 아이가 보는 곳에서 이불천만 갈아주곤 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무탈하게 자라 아빠보다도 훨씬 덩치가 크지만, 여전히 그 솜이불을 덮고 잡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함께 수락산에 올랐습니다. 산에 가기 싫어 이리 빼고 저리 삐죽거리던 어린 녀석에게 산에 가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고 살살 꼬여 귀임봉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때도 이곳에는 오늘처럼 아이스크림을 팔았습니다. 둘이서 아이스크림을 맛나게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산에서 내려올 때가 아이와 함께한 가장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쁘게 열심히 산다는 핑계로 아쉽게도 아이와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했기에 이런 소소한 이야기도 추억거리가 되나 봅니다.
인생은 다 때가 있어 그때그때 할 일을 해야 하고, 그때를 잃지 않고 추억을 만들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덜할 듯합니다. 가뜩이나 아쉬움이 많은 삶의 그림은, 지나고 나면 영영 그때의 그림으로 다시 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이스크림의 유혹 따위에 넘어갈 리가 없겠지만 추억은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와 아빠의 직장과 가까운 동작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모든 게 서툴렀던 젊은 초보 아빠가 반백이 된 지금, 어설프고 힘들기만 했던 그 시절의 추억만은 가슴속 깊은 수문을 열고 계곡물이 되어 폭포처럼 아름답게 쏟아지는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숲처럼 우리네 삶도 변하고 또 변하는데... 추억은 언제나 제자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