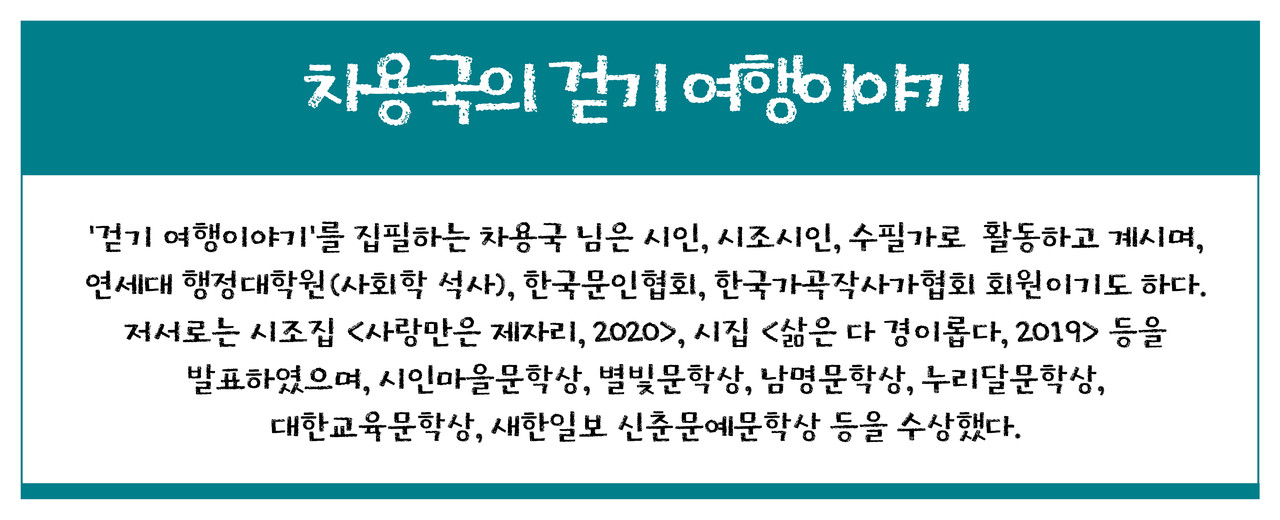

조금 더 너그러운 세상으로 가는 여행
- 서울 불암산행
화랑대역에서 바라보는 옛 철길은 시골 간이역을 연상케 합니다. 도심 속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봄날입니다. 봄비가 스치듯 지나가면서 증표로 꼬리를 남겼습니다. 미세먼지 몰아낸 하늘에 그린 구름 꼬리. 바쁜 일에 치인 피곤한 심신을 일으켜 세우고, 새벽의 단잠을 뿌리치며 길을 나선 보람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백세문을 지나 새순이 눈 비비는 숲길은 평온합니다. 생강나무꽃과 진달래꽃이 반겨주는 즐거운 산길입니다. 멀리 뽀얀 불암산 주봉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옆모습도 순백의 살을 들어내며 멋지게 연기를 합니다. 이 큰 바위 봉우리가 마치 부처가 송낙(모자, 고깔)을 쓰고 있는 것과 같다 하여 불암산이라 부르는 것에 어찌 이견이 있으랴만, 사람들은 불암봉, 천보산, 필암산, 붓바위산 등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별내 쪽 사람들은 아예 내놓고 천보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암봉 아래 굴이 있고, 그곳에 천연보궁 천보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밑바위(여근석)와 마주 섰습니다. 내가 본 여근석 중에 가장 큰 바위인 듯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민망하게 자리잡고 있으니 얼른 사진 한 장 찍고 공룡바위 쪽으로 걸어갑니다. 공룡바위는 이름처럼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여운 도롱뇽과 잘 어울릴 듯싶습니다. 하긴 아기공룡 둘리라는 귀여운 캐릭터도 있으니, 맞니 안 맞니 꼬치꼬치 따질 일은 아난 듯합니다. 더구나 이 너그러운 산길에서는.
전망대 앞에서 방송인 최불암 시비를 봅니다. 불암이란 이름을 빌려 쓴 것에 감사하는 매우 겸손한 시비입니다. 매사 겸허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의 인품과 일체가 된듯한 글이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북한산과 도봉산의 말쑥한 봉우리들이 고개를 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꼬리를 남겨놓고 스치듯 지나갔던 봄비가 꼬리를 찾으러 왔나 봅니다. 점심때가 되자 갑자기 진눈깨비가 되어 사선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미처 비옷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비를 쫄딱 맞으며 하산 길에 들어섰습니다. 정상을 등지고.
사실 불암산은 서울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내 쪽이 앞모습인 셈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불암산은 금강산의 한 봉우리였는데, 조선을 개국한 한양에 남산이 없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남산이 되고자 서울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뿔싸! 불암산이 이곳에 와서 물어보니 한양은 이미 남산을 정했다 합니다. 실망한 불암산은 고향 금강산으로 돌아가려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야망과 향수가 어우러진 설화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자연과 사물을 통해 인간 보편적 삶의 모습을 이렇게 멋지게 그려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늘 경이롭기만 합니다.
나는 우둔하여 산길이 전해주는 소리를 다 듣고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찾아가는 발길까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도 하겠지만, 삶이라는 거, 그것이 어찌 이해득실만 따질 일인가? 어쩌면 허무맹랑한 이런 이야기도 삶의 일부가 아닐는지. 그래서 산길을 걷는 것은 조금 더 너그러운 세상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조금 더 풍요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걷는 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