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산성은 고려 시대에 몽고군의 침입에 대항하고자 쌓은 성
벌거벗은 여인상 - 평생 밤이고 낮이고 불경 소리를 들으며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라는 형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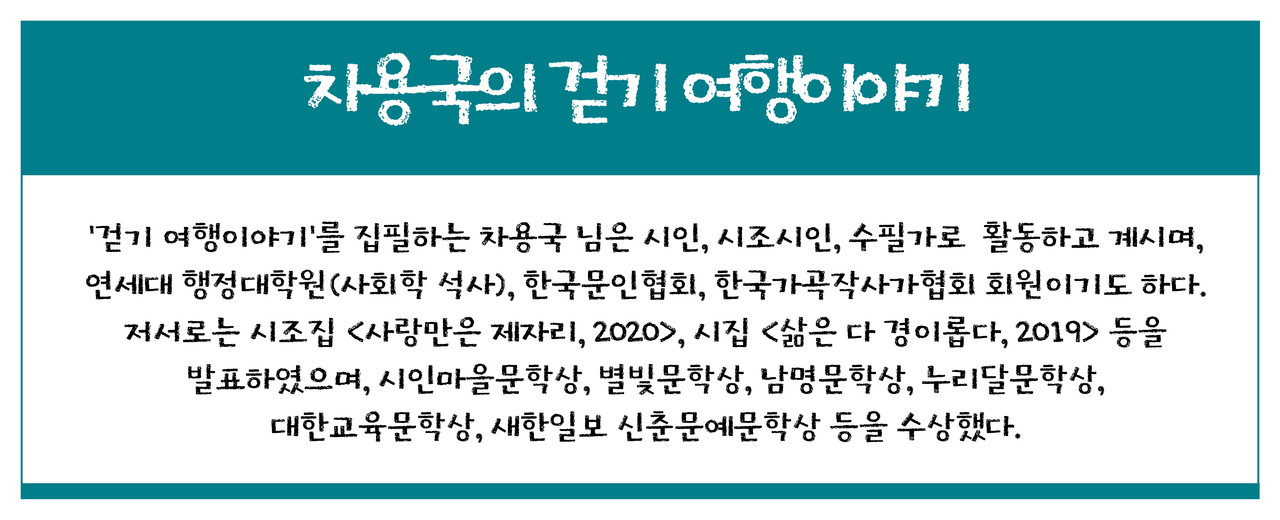

세상사 죄 짓고는 못살 일이다
- 강화도 강화산성 ~ 삼랑성 어어걷기
바다가 보고 싶습니다. 하얀 파도에 일상의 찌든 때를 씻고, 푸른 바다를 가슴에 품고, 수평선 너머에서 떠오르는 흰 구름 몇 점만 담아 해맑은 눈으로 돌아오리라. 지하철 염창역에서 강화도행 3000번 버스를 타고 강화대교를 넘었습니다. 강화산성 남문(안파루)에서 남장대를 향해 성곽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오르막 산길이라 숨이 차오르지만 풍경은 좋기만 합니다. 탁 트인 강화도의 들과 바다가 한 폭의 그림처럼 눈에 들어오는데,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어 보니 육안으로 보는 풍경과 다르게 보입니다. 흐릿합니다. 어떤 풍경이 진실일까?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남장대에 오르니 강화도의 전경이 두루마리 펴지듯이 펼쳐지고, 때맞추어 바람도 하늘하늘 시원하게 불어주니 덩달아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과 터미널 주변 가게에서 산 강화인삼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나니, 캬! 이 기분 짱이야!
강화산성은 고려 시대에 몽고군의 침입에 대항하고자 쌓은 성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실권을 쥔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가문이었던 최씨 정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의심을 피해갈 수는 없을 듯합니다. 항전을 결심하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최우의 명분이야 고려 왕실을 보존하겠다는 것이었겠지만, 그들이 육지에서 공수한 물자로 호위호식하며 정권놀음을 하고 있던 39년 동안, 전국의 백성들은 몽고군의 만행에 처참하게 유린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화저수지 둑길을 한가롭게 걸어와 서문(첨화루)에 이르러 발을 멈추고,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식당으로 직행합니다. 어쩌랴. 여기 칼국수샤브와 쭈구미비빔밥을 피해갈 수 있으랴. 여행의 참맛은 입맛 아닌가?
북문(진송루)과 고려궁 승평문을 거쳐 동문(망한루)을 지나면, 6.25 때 순국한 현충탑이 외롭게 서있습니다. 강화도는 우리 역사의 정치적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이 즐비하고, 단군과 연개소문의 설화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추억마저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구한말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도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오면 많은 생각에 젖곤 합니다.
꿀 같은 휴일 아침잠을 애써 떨치고 힘들게 강화도에 왔는데, 강화산성 한 바퀴 걷고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친김에 삼랑성에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는 무거운 내 발처럼 투덜투덜 해안선을 달리고, 무언가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툭툭 두서없이 따라옵니다. 서울의 수문 역할을 해왔던 강화도. 예전에는 수많은 외세침략과 방어의 역사적 현장이었지만, 지금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섬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평화의 덕분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소망하고 지키려는 노력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멀지 않아 강화산성에는 진달래꽃이 만발할 것이고, 오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강화도는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을 전해줄까?
삼랑성에 도착했습니다. 삼랑성은 일명 정족산성이라고도 합니다. 삼랑성은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고 전해집니다. 삼랑성 안에 전등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절은 고구려 시대 소수림왕 때 진종사란 이름으로 창건했다고 합니다. 이후 고려 시대 충렬왕 때 정화궁주가 옥등을 시주하면서 전등사라 불렀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의 역할도 했습니다. 숙종 4년(1678년)부터 조선왕조실록을 이곳에 보관하기 시작하면서 왕실의 각별한 비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사고는 당시의 영예를 추억으로만 간직하면서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사고 자체도 귀한 문화적 건축물이기에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담 너머로 구경만 할 뿐입니다.
전등사 대웅전 마당에 들어서면 관광객이 꽤 많습니다. 그들은 어울려 대웅전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대웅전에 들어가 예불을 드리기도 합니다. 나는 대웅전에 올 때마다 황망한 광경과 마주쳐 깜짝 놀라곤 합니다. 부처님을 모셔놓은 수도의 도량에서 민망하게 벌거벗은 여인이라니...... 대웅전 지붕을 올려봅니다. 네 귀퉁이 기둥 위에서 벌거벗은 여인상이 추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얼마나 크게 지은 여인이기에 이런 업보를 치루고 있을까? 아무리 형벌이라도 이리 수치스럽고 가혹할 수 있을까? 전해오는 말을 들어보니 더욱 가엾기만 합니다. 이 여인은 조선 광해군 때 대웅전을 짓던 도편수가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도망간 아랫마을 여인을 목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도편수는 이 여인의 형상을 만들어 추녀의 무게를 떠받치게 했다고 합니다. 평생 밤이고 낮이고 불경 소리를 들으며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라는 형벌이었습니다. 세상사 죄 짓고는 못살 일입니다.
성곽길 망루에 올라섰습니다. 탁 트인 강화 벌판은 풍요롭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는 구름이 평화롭게 노닐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새하얀 구름의 이동이 흥겨운 듯 춤을 추고 있습니다. 노을 저편에서 바닷바람이 땀을 쓸어갑니다. 언제 여름이 있었나 싶습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는 눈 감아도 파도 소리처럼 바다를 건너오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