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길을 걸어가는 것은 개방된 사유의 세상을 찾아가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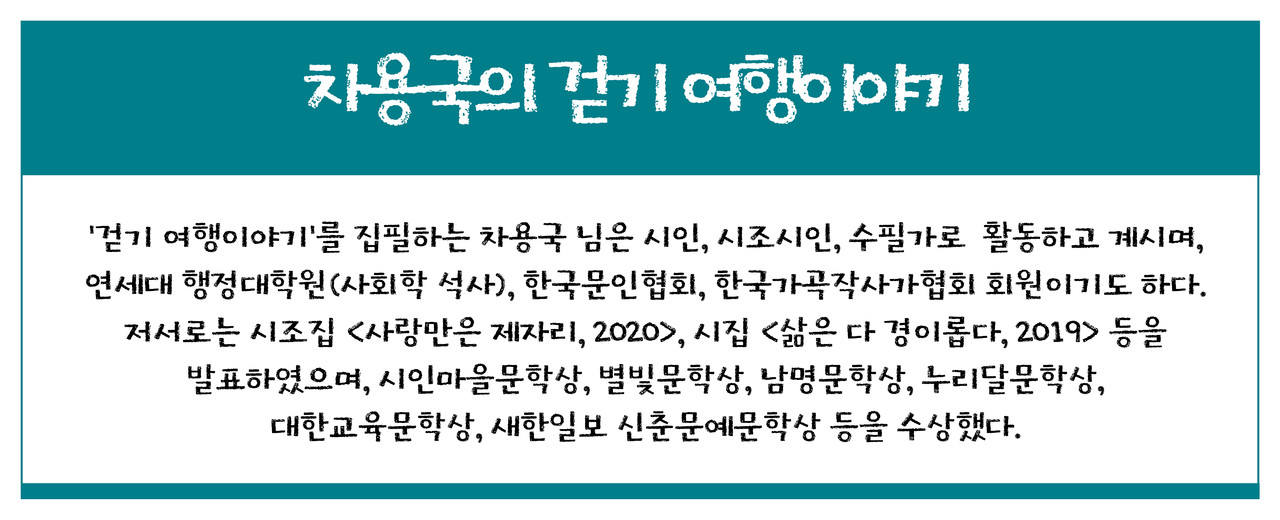

선비의 품격과 장군의 기상
- 북한산행
청명한 하늘입니다. 불광역 2번 출구 주변에는 등산복 차림의 인파로 가득합니다. 홀로 걷는 사람, 일행들과 어울려 걷는 사람들 속에서 나도 ‘구름정원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산객들의 옷차림과 모습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표정도 밝기만 합니다. 그러기에 산길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사람이 되나 봅니다. 산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든 친구가 되나 봅니다. 산길은 오로지 자신의 두 발로만 걸어야 하는 일이기에, 돈과 명예와 또 다른 어떤 세속의 관심거리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마나 봅니다. 산길에서 만난 사람은 자신이 걸어온 길의 풍경과 걸어갈 새로운 길을 이야기 합니다. 산길에서는 있는 그대로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산길을 걸어가는 것은 개방된 사유의 세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두려움이나 비겁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취향과 공감과 선택에서 자유롭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림사에 왔습니다. 선림사 출입문에는 다소 코믹한 불화(佛畵)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 잘 알려진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 관우, 장비, 재갈공명이 극락왕토를 지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유비, 관우, 장비의 발밑에 깔려 있는 인간의 얼굴은 고통스럽기만 한데, 재갈공명의 발밑에 깔려 있는 인간은 웃고 있습니다. 극락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함의일까? 정통 불화인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오래된 작품인지는 나의 짧은 미술 지식으로 알 수가 없지만, 인간의 삶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한 상상력이 독특하기만 합니다. 산길에서는 이런 소소한 것도 이야깃거리가 되나 봅니다.
기자촌 쪽으로 산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향로봉이 먼저 고개를 들면서 인사를 하고, 북한산의 연봉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객은 산길을 걸어가며 육안으로도 보고 심안으로도 봅니다. 같은 길을 함께 걷는 산객마다 본 것이 서로 다른 것은 심안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삶의 길에서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저마다 다른 것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제아무리 잘났어도 누구든 자신이 살아온 시대와 환경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관념의 틀에 갇히곤 합니다. 관념에 빠져 살아가는 날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에고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폐쇄적이 되어갑니다. 폐쇄적인 사람은 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옹졸하고 비겁해집니다. 고집이 세지고, 남의 일에 딴지를 잘 걸고, 자기 생각, 자기 말만이 옳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내면에 숨어있는 자신의 폐쇄성이 들통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은폐하고 싶은 비겁한 포장과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은평 한옥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개울가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거목의 그늘 아래 앉아 쉬며 간단한 간식을 먹고 땀을 식히며 한옥으로 단장한 ‘셋이서문학관’을 바라봅니다. 셋이란 중광 스님, 천상병 시인, 이외수 소설가를 말합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 만나 의형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광 스님과 천상병 시인은 귀천하셨고, 이외수 소설가는 화천 감성마을에 계십니다. 내가 몇 년 전 화천에 들렀을 때, 이외수 선생님은 암 수술 후 요양 중에 있었기 때문에 만나 뵙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삶의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인연이라 하지만, 정과 의를 나누며 살 수 있는 진솔한 벗이 있다는 것은 더 없는 행운일 듯합니다. 요즘처럼 만남조차도 실리를 따져 친소의 거리를 계산하는 세태를 무턱대고 나무랄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속내를 펼쳐 보일 수 있는 벗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관사 계곡을 따라 올라갑니다. 진관사는 유서 깊은 고찰이고 얽힌 사연이 많습니다. 진관사란 이름은 고려 시대 현종이 진관대사의 은혜에 보답하여 하사한 데서 유래합니다. 경종이 죽고 목종이 왕이 되었으나 아들이 없어 대량원군을 왕위 계승자로 정했습니다. 경종의 왕비는 파계승 김치양과 정을 통해 나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대량원군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대량원군이 북한산 신혈사에 있는 것을 알고 자객을 보냈습니다. 진관대사는 이 자객이 대량원군을 죽이러온 것을 눈치 채고 불상 밑 지하 굴로 대량원군을 피신시켜 죽음을 모면하게 했습니다. 3년 후 왕이 된 대량원군은 신혈사 자리에 큰 절을 짓고 진관대사의 이름을 따서 진관사라 명했습니다.
진관사에서 온 길로 다시 내려와 은행나무숲을 지나 삼천사로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삼천사는 신라 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원효봉 밑에 안락하게 자리를 잡은 삼천사는 한때 3.000명의 승려들이 수도한 큰 절이었다고 합니다. 삼천사란 이름도 이 숫자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임진왜란 때는 승병들의 집합소였다고도 합니다. 내가 이 절에 오면 꼭 보는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대웅전 뒤 자연석 바위에 새겨진 암각 불상입니다. 마애석가여래입상이라고 하며, 보물 제65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통일신라 말 또는 고려 초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옷주름선과 상투 모양, 온화하고 자애로운 얼굴 등, 당시 사람들의 옷차림과 인물상에 관한 특징을 이해하는 데도 소중한 증표입니다.
북한산은 내가 가장 많이 찾은 산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걷지 않은 길이 많기만 합니다. 겨우 휴일 산객인 나에게 그 많은 길을 다 내어줄 산이 아닙니다. 길도 많고, 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역사도 길고 길어 사연도 참 많습니다. 나는 바람과 구름과 물소리가 전해주는 사연을 듣고 싶어 이 산을 찾기도 하지만, 이 산 자체의 기품에 매료되어 찾기를 멈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산은 원래 삼각산이라 불렀습니다. 삼각산이란 쥐라기 말 화강암이 돔 모양으로 솟아오른 3봉(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에서 유래합니다. 알차게 푸른 능선 위로 우뚝 솟아오른 크고 뽀얀 흰 봉우리는 정갈하고 고상합니다. 선비의 품격과 장군의 기상이 하나로 어우러진 천하명봉의 자태입니다. 어설픈 산객들이 좋아하는 잡봉 많은 바위산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어찌 이 산을 찾아 걷지 않고 견뎌낼 수 있으리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