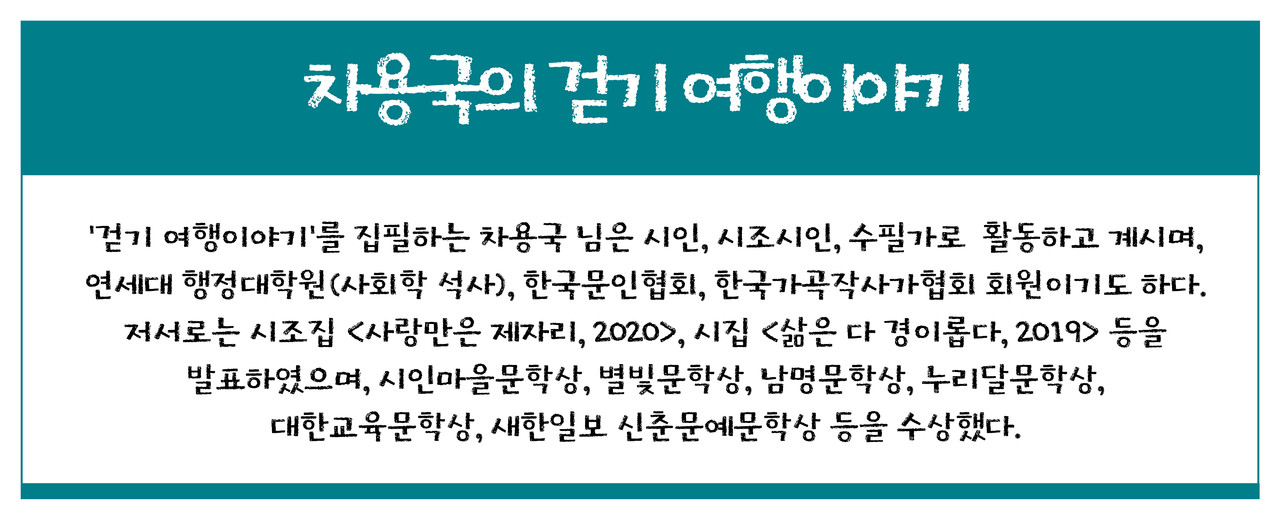

내 추억의 뒤통수
- 계룡산 수통골행
대전시 유성구로 뻗어 내린 계룡산의 마지막 능선 한 자락을 붙들고 흐르는 계곡, 수통골. 어렸을 적에 겨우 한두 번 소풍이나 갔었던 외진 산길을, 어느덧 반백이 된 친구들과 걸어간다. 참 많이도 변했구나! 겨우 물이나 빠져나갈 수 있었던 첩첩 산골짝이가 이렇게 현란한 공원이 되어 있다니. 이제는 내가 타향의 낯선 산객이 되어 두리번거리며 길을 찾는다. 제 아무리 변했어도 원래의 그 모습이야 어디엔가 남아있겠지.
수통골이란 말은 도덕봉, 금수봉, 빈계산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이나 통하는 긴 골짜기에서 유래한다. 전해지는 일설로는 의상대사가 도덕봉 아래 골짜기에서 수도한 후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물이 통하든 도가 통하든 통하면 다 좋은 것이니, 더하여 바람도 통하고 친구도 통하면 뭐 더 바랄 게 있으리오.
사실 수통골 계곡은 건천이다. 물은 계곡의 돌 밑으로 흘러내려와 소를 이루고, 또 다시 돌 밑을 흘러와 소를 이룬다. 그래서일까? 수통골 계곡 물은 맑고 깨끗하다. 금수봉에 올라서면 대전 시가지와 계룡산 천황봉이 반갑게 다가선다. 엄청 탈바꿈한 내 고향을 낯선 산객이 되어 한참을 바라만 본다.
1983년 대전시가 확대되면서 대덕군을 편입하고, 대덕연구단지와 청급 정부종합청사가 이전하면서 대전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인구 증가는 기반 시설의 확충과 레저 시설의 증편을 수반한다. 홀대받던 수통골은 이 변화의 산물이다. 건천에 연못을 만들어 계곡에 사시사철 물이 흐르게 했다. 물론 계곡 상류는 여전히 건천이고, 하류 쪽에 연못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대전 사람들은 삽재고개를 넘어 동학사와 갑사로 가는 길을 따라 계룡산에 갔다. 그때 생각하는 계룡산은 공주시 동학사 입구를 시작점으로 보았다. 유성 사람들도 다를 바 없었다. 금수봉과 빈계산 등으로 둘러싸인 수통골을 계룡산으로 볼만큼 넓은 시야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확장된 세상에선 그에 상응한 인식과 견해의 변화가 제기된다. 대전시로선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계룡산과 결부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대전시는 금수봉과 빈계산 등으로 이어지는 숲길을 잘 닦아 계룡산의 등산길 줄기로 변신시켰다. 그 시작점이 수통골이다. 이제 수통골은 계룡산 변두리의 방계계곡이란 오명과 설움을 벗어나 계룡산 어느 곳보다도 찾는 사람이 많고, 사랑을 듬뿍 받는 곳이 되었다.
세상만사가 변하고 변하는 게 이치라고 했던가? 지금 비록 어줍고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힘차게 기상할 수 있다는 믿음 내지 희망은 갖고 있어야 좋을 것 같다. 다만 그 기회의 변곡점을 기다리는 지루한 여정을 견디면서 다져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견지할 수 있는가가 요체일 듯싶다.
해가 중천에 있다. 시계를 보니 점심 약속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서둘러 계곡을 내려온다. 계곡의 응달에는 더러 눈의 흔적이 남아있어도 봄기운은 피해갈 수 없는 듯하다. 여기저기서 새순의 앙증맞은 저항이 싱그럽다. 수통골 입구에 예약한 식당으로 들어선다. 벌써 어머님과 형제들이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다. 짝꿍은 여기까지 와서 새벽부터 등산이냐고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지만, 못 본 척 태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아 음식을 청했다. 이 식당은 물어볼 것도 없이 촌두부 한상 차림이니 음식을 오래 기다릴 것도 없다. 어머님은 비록 틀리를 하고 계시지만 한상 차림을 넉넉히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니 안심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내 눈은 어느새 엄마의 검지 손가락에 가있다. 매년 마른 장작처럼 변해가는 엄마의 검지 손가락. 당신의 서럽고 서러운 삶의 모든 것이 그곳에 있는데, 엄마는 평생 아무런 말이 없고, 매년 추위가 다 가시지 않은 이른 봄이면 내 추억의 뒤통수만 핏빛이다. 벌이도 없이 한량처럼 읍내를 싸돌아다니는 아버지의 양복에서는 늘 술 냄새가 진동했다. 엄마는 온종일 밭일, 집일, 쉴 틈이 없이 일만했다. 해질녘이면 볏단을 썰어 쇠죽을 쑤는 일도 엄마의 몫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물을 썰던 엄마의 외마디 비명! 이미 작두의 칼날이 엄마의 검지 손가락을 갈라버린 후였다. 엄마의 검지 손가락은 영영 봉합되지 않았다. 엄마는 평생 반쪽 검지 손가락으로 살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가 서러운 공포에 울부짖던 그날. 그날이 엄마의 생신인 이때쯤이었다.
이른 봄 짧은 해가 서성이는 천황봉은 핏빛이다
술에 쓰러진 한량(閑良)의 가벼운 양복에 얼룩진 핏빛이다
허기진 소 혓바닥에 맺힌 핏빛이다
작두에 잘려나간 여물 속에서 흘리는
검지 손가락의 서러운 핏빛이다
“할머니 여기 손가락 왜 없어?”
“우리 예쁜 손녀 달라고 까치에게 주었지”
수통골 계곡처럼 메마른 손을
아랫목 이불속에 넣고 환하게 웃는 엄마
“까치야 우리 할머니 손가락 내놔”
“까치야 까치야 우리 할머니 손가락 내놔”
엄마의 검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내 추억의 뒤통수는 여전히 핏빛이다
(졸시, 검지 손가락,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