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기술이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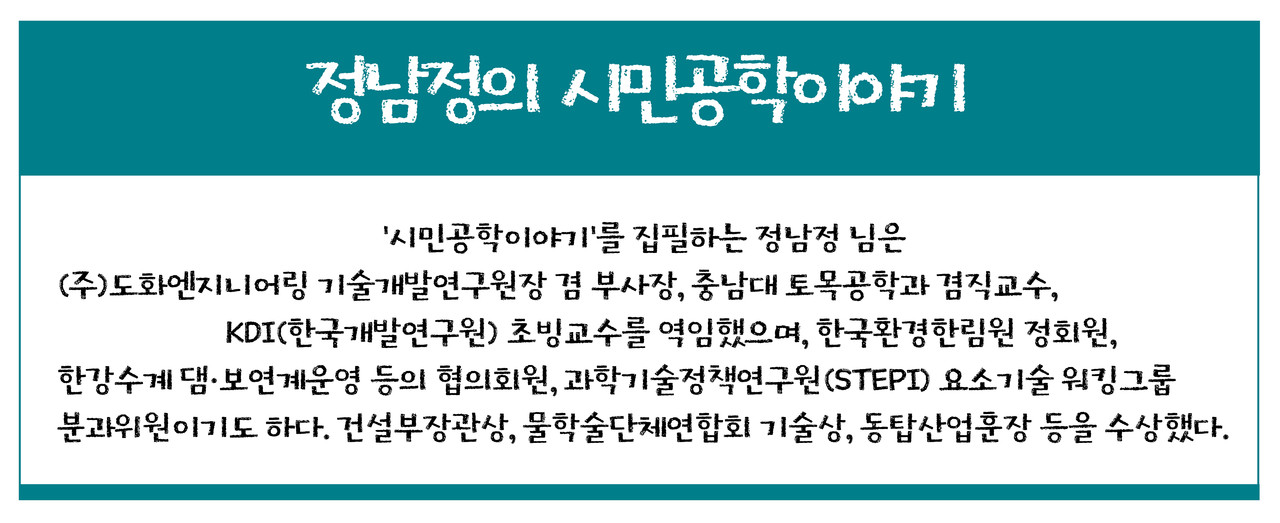
우리나라는 가뭄으로 인한 한발(旱魃)뿐 아니라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도 천재지변(天災地變)이냐 아니면 물관리를 잘못하여 일어난 인재(人災)이냐를 놓고 매년 갑론을박(甲論乙駁)을 되풀이하고 있다.
2020년에도 제5호 태풍 장미(JANGMI), 제8호 태풍 바비(BAVI), 제9호 태풍 마이삭(MAISAK),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제5호 태풍인 장미로 인하여 2020. 8. 8에 용담댐과 섬진강댐 하류가 침수되었고, 낙동강에는 제방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은 댐의 방류로 홍수를 키워 일어난 인재라고 하고, 정부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물관리가 어려운 국가에 속한다. 태풍을 동반한 연 강수량의 2/3가 여름 홍수기에 집중되고, 갈수기에는 홍수기에 저장된 물이 없으면 생활 및 산업 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물관리 환경에서 단순히 인재냐 또는 천재지변이냐를 놓고 갑론을박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매우 비생산적이라고 생각이 든다.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였지만, 여전히 물관리 시설인 하천, 다목적 댐, 용수 댐, 발전 댐, 농업용 댐의 관리주체가 중앙정부, 지자체와 K-water, 한전, 농어촌공사로 분산되어 있다. 홍수통제소에 홍수조절 및 물 이용에 대한 최종 승인권이 있지만, 이는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홍수피해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세우는 공학적 접근보다는 책임소재를 떠넘기고 지역주민들은 피해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 경우가 허다하다.
물관리 시설은 우선 설계기준에 의하여 계획하고 건설한다. 어떠한 자연 재해도 감당할 수 있도록 건설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설의 중요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 등을 검토하여 그 기준을 5, 10, 20, 30, 100년, 그리고 가능 최대강우량 또는 하천으로 흐르는 홍수량으로 할 것인지 검토하여 계획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홍수피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설계오류, 부실 공사와 준공 이후 시설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소홀로 시설이 파괴되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수칙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인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설계기준을 떠나 운영관리의 잘못에 대한 논란은 매년 일어나고 있으며,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법정에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공학의 관점에서 천재지변(天災地變)과 인재(人災)를 구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모호한 이유는 기상조건(氣像條件)이 모두 다르고 유사한 재난은 있지만 동일한 재난은 없기 때문이다.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처음 언급된 초지능(super-intelligence), 초연결(hyper-connectivity), 초융합(hyper-convergence)의 4차 산업혁명기술(4I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이 천재지변(天災地變)과 인재(人災)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의 기상 데이터와 더불어 물관리 시설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운영데이터, 그리고 이를 분석한 빅데이터(Big Data)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기술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다양한 학습알고리즘과 3차원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이용하여 최적의 물관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분명 인재(人災)가 아니라 천재지변(天災地變)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알고리즘을 개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현재로서는 시공간적인 여러 제약조건을 감안하여 사람이 신속하게 시각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물관리 기관은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관련 기관들과 엔지니어들은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비해야 하며, 토목공학도 여타 엔지니어링 분야보다 뒤처진 4 IR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혁명(Digital Transformation) 교육과 투자에 힘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