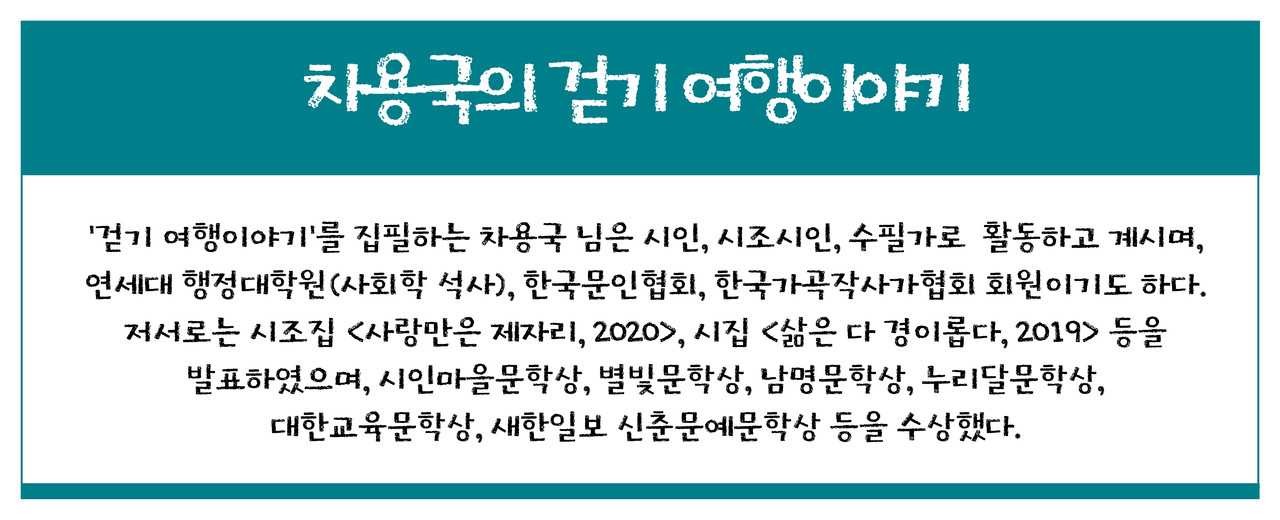

산은 높고 바다는 깊네
- 과천 과지초당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2번 출구를 나와 원터골로 들어섰습니다. 이 마을을 원터골이라 부르는 것은 조선 시대에 큰 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교통의 요충지에 둔 역을 말합니다. 지금은 옛 원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고, 음식점이 골목을 사이에 두고 냄새를 흔들며 산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계곡은 얼음을 두껍게 깔고 동면에 들어갔지만 맑고 깨끗한 물소리가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 숨결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소리가 있기에 청계산입니다. 푸른 물이 흐르는 계곡 말입니다. 한때 이 계곡에 살던 용이 승천하였다고 하여 청룡산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진달래 능선을 오릅니다. 진달래꽃이 피기에는 이른 시절이지만, 이 길은 산객들이 즐겨 걷는 길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누워있는 완만한 능선을 따라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매력 때문일 것입니다. 여인의 한과 슬픔이 꽃잎에 닿아 붉은색이 되었다는 진달래꽃의 꽃말이 '이별의 한'이라고 합니다. 이 능선은 따라가면 맨 처음 옥녀봉을 만납니다. 옥녀봉은 봉우리가 예쁜 여성처럼 보여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흔한 표지석 대신 둥근 시계와 태극기를 꽂아놓은 표지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발끝 아래에 경마장이 있고, 그 건너 관악산이 손을 내밀면 잡힐 듯이 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전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시야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인 매봉으로 오르는 길을 접고 과천 삼부골 쪽으로 하산합니다. 사실 오늘 산행은 청계산 정상에 오르거나 일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옥녀봉을 넘어 추사박물관이 있는 과지초당에 들릴 계획입니다. 삼부골 산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한적한 능선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있고 까마귀가 오고 가며 까악까악 말을 건넵니다. 이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주암동에 닿습니다. 경마공원 뒤쪽입니다. 이곳에 추사박물관과 과지초당이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1786-1856년)는 8년 3개월간의 제주도 유배(1840-1849년 / 55-64세)에서 풀려난 지 2년 반 만에 다시 1년간의 함경도 북청 유배(1851-1852년 / 66-67세)를 마치고 과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추사가 과지초당에 온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0여 년간의 긴 유배형은 가혹했습니다. 가문은 몰락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늙은 몸을 의탁할만한 마땅한 거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월성위궁은 팔렸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 시대의 대학자요 최고의 예술가였건만 유배가 풀린 추사의 처지는 초라했습니다.
다행히 과천의 초당은 남아있었습니다. 이 초당은 추사의 아버지 김노경이 한성판윤으로 있을 때 청계산 옥녀봉 북쪽의 산기슭에 마련한 별서였습니다. 추사가 39세(1824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함경도 북청 유배가 풀려 과천에 온 추사는 4년(1852-1856년 / 67세-71세)을 독서와 글쓰기를 하며 소일했습니다. 난을 치고 제자를 가르치며, 수시로 봉은사를 왕래하며 불교에 심취해서 살다가 71세의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현대식 박물관 옆에 과지초당 현판을 단 옛집 마당에서 추사의 동상만이 언 연못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날 좋은 시절에도 찾아오는 이 드문데 이 엄동설한에 오죽하랴. 그렇다고 인간이 문화와 예술과 삶의 가치가 어우러진 생명체이기에 존엄하다는 것을 눈곱만치도 생각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권력과 돈을 숭상하고 탐하다 결국 억울하게 빈손으로 떠나는 우리 시대의 경박한 인생 군상을 탓하랴. 추사의 말년도 지금처럼 쓸쓸했으리.
예산에서 태어난 추사는 박제가의 제자가 되어 수학하면서 북학파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학식과 예술, 그리고 과학적 지식을 겸비한 인물로 성장하는 계기는, 젊은 시절(24-25세) 동지부사로 임명된 아버지 김노경의 자제군관으로 중국 청조 연경 방문이었습니다. 추사는 당대 청조 최고의 고문과 금석학의 대가인 옹방강, 완원과 같은 인물과 교류하면서 학문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조선에서 추사만큼 고금의 글을 체험한 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사체는 그의 타고난 자질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신라 진흥왕이 북한산 비봉에 세운 순수비를 고증한 것도 이런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과지초당 옆 현대식 건물인 추사박물관에 들러 추사의 작품을 감상합니다. 과천 추사박물관에는 추사 연구의 대가였던 일본인 후지쓰카 지카기 교수가 평생 수집한 추사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경성제국대학 중국철학 교수이기도 했던 후지쓰카는 추사의 청 및 조선의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했습니다. 추사에 관한 그의 업적은 지대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추사 작품의 평판과 가치는 그의 덕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아키나오는 선친에게 물려받은 자료의 기증을 원하는 동경대학 도서관의 요청을 뿌리치고, 2006년에서 과천 추사박물관에 총 1만 5,000여 점을 기증했습니다.
아키나오는 한국인이 계속 추사를 연구하는 데 활용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아키나오에게 문화훈장 목련장을 상신했고, 병상에서 훈장을 받은 아키나오는 두 달 후 향년 9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대작의 발견과 가치는 국경을 초월해서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사는 조선 최고의 명필가답게 많은 글과 그림을 남겼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가 제주도 유배 시절(1844년) 이상적에게 그려준 세한도를 최고의 걸작으로 꼽곤 합니다. '세한'이란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날이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평판에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추사가 과천 시절에 쓴 글, '산숭해심(山崇海深) 유천희해(遊天戱海)'를 최고의 걸작에서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산은 높고 바다는 깊네 하늘에서 놀고 바다에서 노닌다’는 높이 42센티미터, 길이 420센티미터나 되는 큰 글씨입니다.
한 시대의 대학자요 최고의 예술가였던 추사 김정희는, 이 8자에 자신의 인생 모든 행적과 사후 저승의 소망까지도 함의하는 글을 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멸의 붓은 시대를 관통하여 저승의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메시지는 아니었을까?
객지를 떠돌다가 한양에 돌아오니
옥녀봉 끝자락에 초당만 남았구나
인심이 떠나간 마당 희롱하는 잡풀들
처마 밑 강아지도 말을 잃고 누웠는데
어이해 홀로 깨어 새벽달을 지키는가
구름을 타는 달빛도 솔잎 위에 앉았네
한살이 아름차다 영화는 순간이다
백골을 두드려도 다시 올 리 없는 세월
붓길에 펼쳐진 세상 산숭해심 유천희해
(졸시,「산숭해심 유천희해 - 과지초당에서」,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