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자살률 OECD 1위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에서 숲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정신건강의 회복과 생명 예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산림치유’가 의료계와 국가기관의 협력 아래 본격적인 자살 예방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경희의료원과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과 연달아 만나 산림치유를 자살 예방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검토했다. 이는 치료 중심의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자연·사회적 연결·정서 회복을 아우르는 통합적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다.
산림치유는 숲의 경관, 피톤치드, 자연 음향 등 다양한 자연 요소를 활용해 신체·정신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서는 우울증 외래 환자의 BDI 점수가 31.5점에서 17.6점으로 낮아지며 중증에서 중등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지수는 35.9% 감소해 자연 환경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변화를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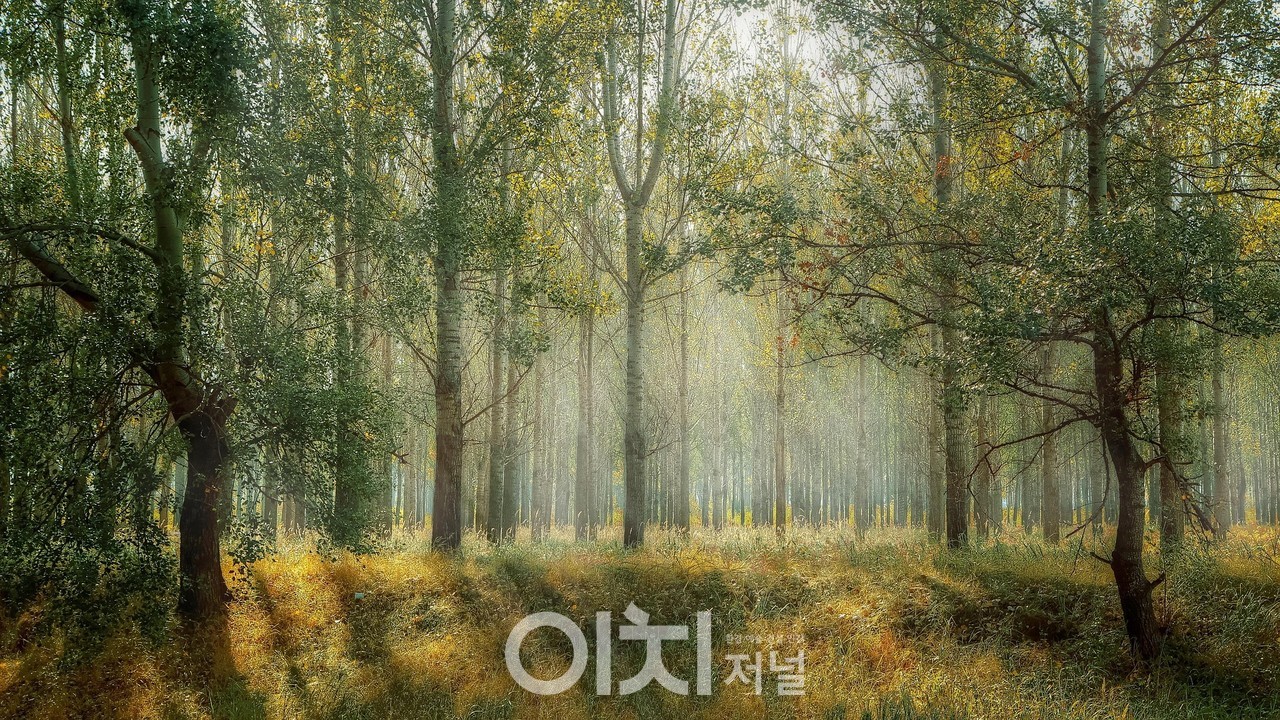
청소년 사례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도는 8.1% 향상됐고, 요보호 아동의 우울 수준도 SCL-90-R 기준 평균 2.3점 감소했다. 숲이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아동·청소년의 심리 회복에 기여한다는 근거가 축적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거주지 주변 숲 비율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보다 8년간 자살 시도 위험이 21% 감소했고, 일본 연구에서는 중·노년 남성의 자살률이 평균 5.5% 낮게 나타났다. 자연환경 접근성이 정신건강과 직접 연결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산림치유가 치료의 대체재는 아니지만 불안·우울 완화의 강력한 보완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백종우 교수는 치료 외에도 사회적 연결망과 개인의 삶의 가치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전홍진 교수는 자살 유가족의 자살률이 일반 인구보다 22.5배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 가능성도 제시됐다. 서효창 연구원은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효과가 입증된 자연 노출을 은둔·고립형 고위험군이 손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VR·모바일 기반 산림치유 콘텐츠 도입을 제안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자살 고위험군별 특성과 필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산림치유 기반 자살 예방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위기 시대, 숲이 새로운 공공의 치료 자원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