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이야기 그 첫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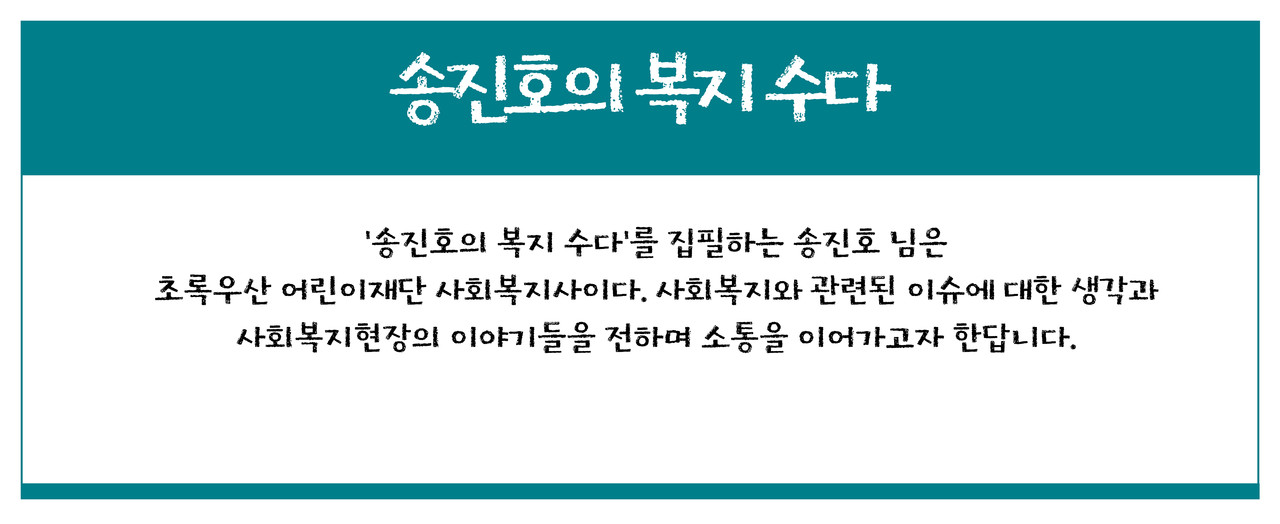
2021학년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코로나 19가 아니었다면 이미 치러졌어야 하지만 2주가 연기되어 12월 3일 치러진다. 모든 수험생들이 노력한 만큼 그래서 스스로 인정할 만큼의 성적을 얻기를 바란다.
2005년 11월 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쯤 앞둔 어느 날,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별님이(가명)에요. 생일축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여고생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시 내가 근무하던 곳에서는 생일을 맞이한 소년소녀가정 아이들에게 생일케이크와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다. 1년 내내 진행된 프로그램이었지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한 아이는 처음이었다. 처음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던 초짜 사회복지사에게는 신선하고 신나는 일이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나는 별님이에게 수능 전 컨디션 조절 요령, 시험 당일 준비요령, 입시전략 등을 조언해 주며 친해졌고,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서도 연락을 주고받는 스승과 제자 같은 사이가 되었다.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별님이는 입학을 앞두고 나를 찾아왔었고, 그 이후로도 방학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마다 만나서 밥을 먹으며 고민을 들어주곤 했다. 그러다 별님이가 국가지원으로 미국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다. 처음 신청한 학기에는 토익 점수가 모자라 떨어졌다며 엉엉 울었던 별님이는 다음 학기에 기어코 토익 점수를 채워 미국에 가게 되었다.
1년 남짓의 미국 생활, 그저 담당 사회복지사였을 뿐인 내 입장에서는 연락이 끊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에 인터넷 전화번호 하나가 떴다. 무심코 받은 휴대폰 너머로 “선생님, 저예요”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미국 생활 중에도 잊지 않고 연락해 준 별님이에게 참 고마웠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별님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에 입사했다. 대기업을 고집하던 별님이에게 쓴소리를 하다 서운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이제 곧 딸 아이의 엄마가 되는 별님이는 이제 동생 같고 조카 같은 내가 가장 아끼는 제자다. (실제 나의 초등학교 후배이기도 하다)
2012년에는 사랑의 리퀘스트 수기 공모에서 별님이와 내가 동시에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내 글은 직원이 쓴 글 중에 가장 잘 쓴 글로 뽑혔고, 별님이는 대상 후보였으나 신입사원이던 별님이가 방송촬영 협조가 어려워 대상 후보에서 제외되었다)
별님이는 내가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동안 고3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08년 여름부터 2010년까지 근무했던 복지관에서도 입시와 관련된 일화들이 있었다. 2008년 여름 열일곱 살 민성이(가명)를 만났다. 고등학교에 적응을 잘 못 하고 자퇴한 민성이는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처음 민성이의 담당자가 되어 민성이네 사정을 살피던 나는 민성이가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을 알게 되었고, 민성이의 엄마와 민성이에게 대학진학을 권했다. 그 해에 민성이는 지방 국립대에 합격했고, 그다음 해에 편입을 하여 오히려 친구들보다 빨리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았다. 민성이 엄마는 나에게 고맙다며 상품권을 선물하려고 했다. 나는 절대 안 된다며 마다했고, 얼마 후 민성이 엄마는 직접 티셔츠 하나를 사서 내게 주시고는 도망치듯 달려가셨다. 나는 쫓아갈 수도 없었고, 선물마저 마다하면 실례가 될 것도 같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아직도 잘 입고 있다.
2010년 초 합격자 발표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영호(가명)의 유명 A전문대학 합격 소식이 들렸다. 영호는 내가 아니라 동료직원이 담당하던 아이의 형이다. 동료직원이 영호의 어머니와 전화로 상담하는 내용을 들으니 유명 A전문대학에 합격했으나 등록금이 400만 원이라 너무 비싸서 100만 원만 내면 되는 B대학으로 가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영호는 A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다. (내가 담당하던 아동이 아니라 나는 더 몰랐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 번 확인이라도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확인해 보니 진짜 합격이었다. 그런데 등록금 고지서를 보니 본인 부담이 10만 원 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동료에게 알렸고, 동료는 영호를 찾아 사실을 알리고 A대학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10만 원을 내고 A대학에 갈 수 있는 아이가 100만 원을 내고 B대학에 갈 뻔했다. 영호가 A대학에 입학한 후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적응은 잘 했는지... 전공이 적성에는 맞았는지... 무사히 졸업은 했는지... 어쩌면 B대학으로 것이 더 좋지는 않았을까하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결정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보니 소통이 잘되지 않는 아이와 보호자를 만나면 답답함에 가슴을 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는 두렵기도 하다. 그러나 답답하다고 또는 두렵다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동안은 늘 남의 인생 걱정을 하고 살았던 것 같다. 현장근무 13년 만에 본부 근무 3년째... 감동과 보람은 덜 하지만 남의 인생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좋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사실 가장으로서 내 코도 석 자다.^^ 그렇지만 또다시 어려운 아이들의 삶을 마주하게 된다면... 나는 또 그 아이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할 것이다. 나는 사회복지사니까.
